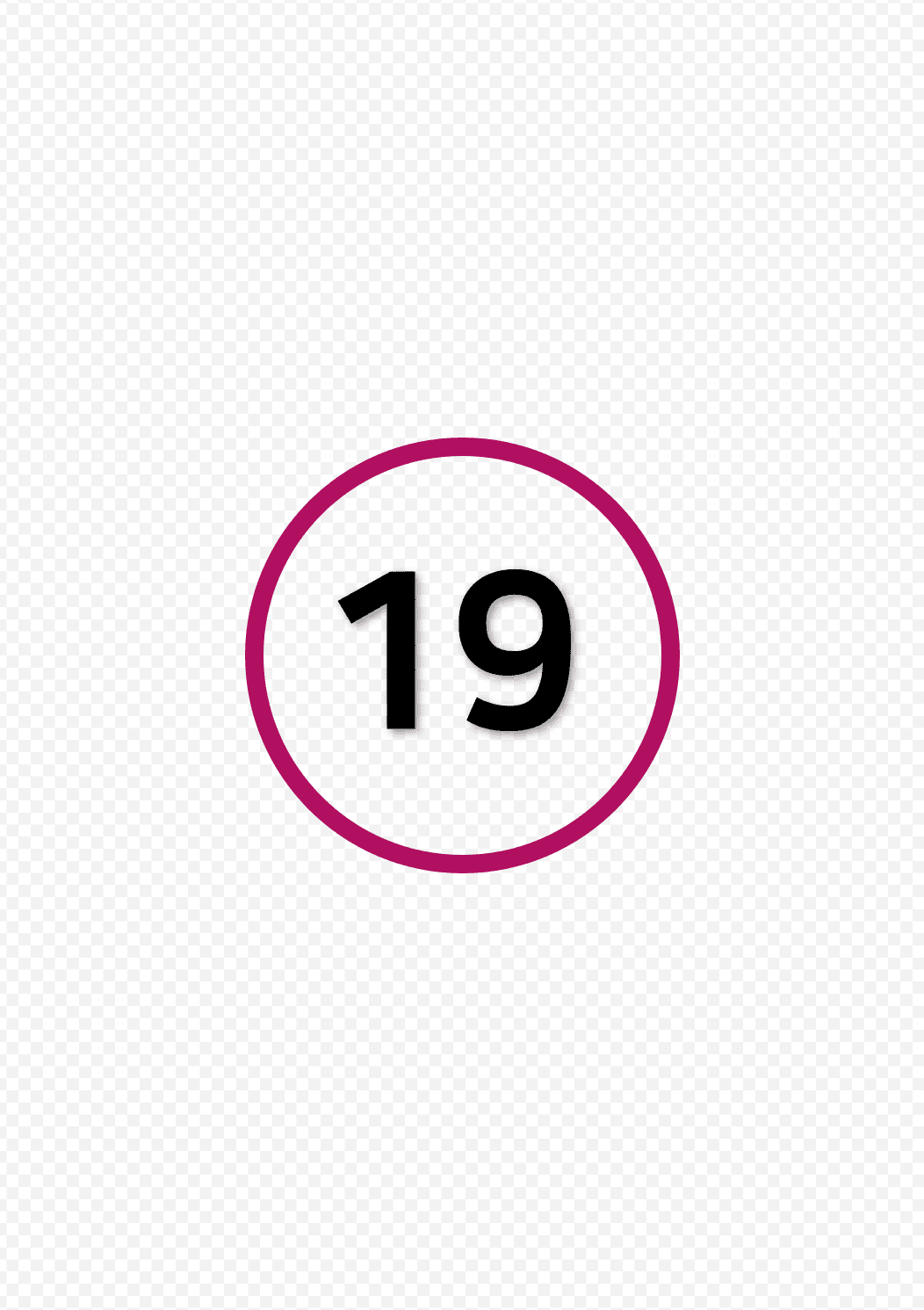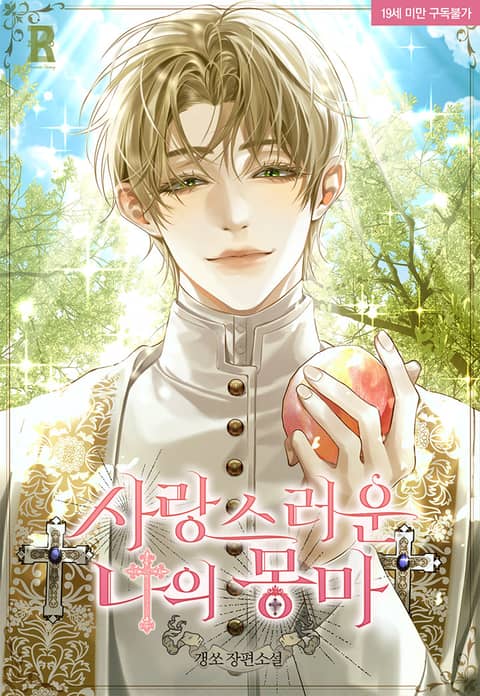자타공인 성북동 꼭두각시, 양순하기 그지없는 둘째 딸. 평생 하라는 대로 하고, 하기 싫어도 순종했다. 철사에 꼬인 분재처럼 삶이 좀 휘둘리고 억압당했어도, 따뜻한 온실 속에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다. 괜찮기는 개뿔? 오직 결혼 하나만큼은 뜻대로 하게 해 달라던 애원마저 무시당하고 난 후에 깨달았다. 누군가의 트로피, 누군가의 복수 도구. 내 삶은 지금껏 내 것이 아니었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아야 한다. 그래! 결심했어! 그러나 나는 무면허였고……. 첫 반항, 첫 가출…… 무엇 하나 순탄치 않았다……. 설상가상 모든 일이 낯설고 두려워 잔뜩 긴장을 두른 내 앞에, 목에 고급 손수건을 두른 백수가 빈정거리며 대문 앞을 막아섰다. “또 모른 척 해봐, 빠순아.” “…….” “바이러스 먹고 뒈진 새끼나 좋아하고.” 내 앞에서 절대로 꺼내서는 안될 ‘그 단어’를 뱉은 남자. 나는 이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
팬덤 지표
신작이라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어요. 🤷
* 신작 기준 : 3개월 이내
🏆명작의 제단
✔️이 작품은 명작👑입니까?
* 100명이 선택하면 '명작' 칭호가 활성화 됩니다.
'명작'의 태양을 라이징 해보세요.
채연실작가의 다른 작품3개

플레어
세상이 합심해서 효신을 농락하는 것 같았다. 나라는 망했고, 부모는 그녀를 버린 데다가, 얻어맞고 줴뜯기는 종년 팔자까지 떠올리자면 효신은 속에서 천불이 이는 듯했다. “조선 밖으로 나간다고 종년살이 벗어날 성싶으냐.” 개중 가장 큰 장작은 단연 주인집 도련님, 윤산영의 냉랭한 눈길이다. 천한 것에게 아량을 베풀듯 시선을 내리는 귀족적인 오만함. 내가 감히 너를 보아 주었다는 못마땅한 눈빛. 게다가 희고 단단한 손놀림으로 바이올린 현을 퉁퉁 튕기는 꼴은 또 어떠한가. 예민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힘차게 활을 휘갈길 때면, 효신은 뱃속에서 간질거리는 화염을 기필코 모른 체해야 했다. “종년 팔자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꼭 붙어 있다가 이 집 귀신이나 될랍니다.” 이 풍진세상을 등지면 펄펄 끓는 화기가 좀 가라앉을까. 차라리 칵 죽어 버리면 이 서러운 불길도 잠잠해질까. 효신은 그렇게 세상에서 제가 삭제되길 소원했다. “……그러든지.” 그녀가 뿜어낸 불티 한 톨이 그에게 옮겨붙어 순식간에 활활 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궁쥐들
※ 해당 작품에는 트리거 유발 소재/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심형남, 스무 살. 본업은 평창동 대저택의 식모. 부업은 박신억 회장의 노리개. 모종의 사건으로 넘버 투인 최은형이 갑작스레 회장 대행으로 집안에 상주한다. 재미도 없는 농담, 저질스러운 손버릇. 최은형은 그녀가 질색하는 깡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도 그랬다. 깡패 자식들이 으레 할 법한 질 나쁜 농담에, 형남은 넋을 반쯤 빼고 손목을 그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최은형에게 붙들려 오만가지 쌍욕을 들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고꾸라지도록 술도 먹여 주었고, 남산에도 데려가 돈까스를 사주었다. 고기를 대신 잘라주며 내내 화를 냈다. “너보다 못한 새끼들도 살아. 아득바득 살아.” 이 남자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마치 내가 못할 짓이라도 한 것처럼.

플레어
세상이 합심해서 효신을 농락하는 것 같았다. 나라는 망했고, 부모는 그녀를 버린 데다가, 얻어맞고 줴뜯기는 종년 팔자까지 떠올리자면 효신은 속에서 천불이 이는 듯했다. “조선 밖으로 나간다고 종년살이 벗어날 성싶으냐.” 개중 가장 큰 장작은 단연 주인집 도련님, 윤산영의 냉랭한 눈길이다. 천한 것에게 아량을 베풀듯 시선을 내리는 귀족적인 오만함. 내가 감히 너를 보아 주었다는 못마땅한 눈빛. 게다가 희고 단단한 손놀림으로 바이올린 현을 퉁퉁 튕기는 꼴은 또 어떠한가. 예민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힘차게 활을 휘갈길 때면, 효신은 뱃속에서 간질거리는 화염을 기필코 모른 체해야 했다. “종년 팔자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꼭 붙어 있다가 이 집 귀신이나 될랍니다.” 이 풍진세상을 등지면 펄펄 끓는 화기가 좀 가라앉을까. 차라리 칵 죽어 버리면 이 서러운 불길도 잠잠해질까. 효신은 그렇게 세상에서 제가 삭제되길 소원했다. “……그러든지.” 그녀가 뿜어낸 불티 한 톨이 그에게 옮겨붙어 순식간에 활활 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